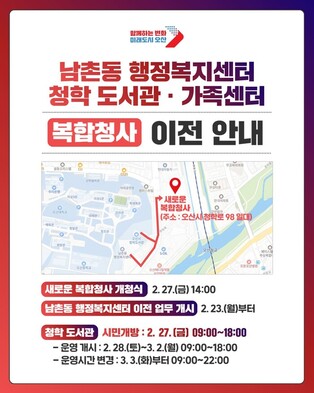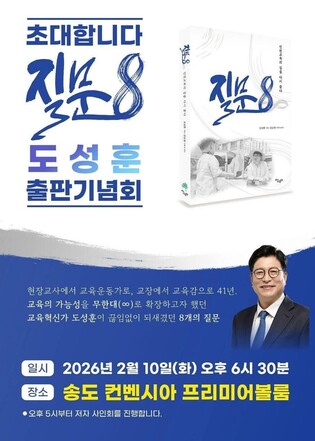사진/ 산양산삼
<수명연장과 세계인구 증가에 따른 먹거리>
1950년도 25억 명이던 세계인구는 2011년도에는 70억 명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50년도에는 100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감소로 걱정하는 것에 비해 개발도상 국가를 위주로 인구증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65세까지 약 50톤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의 생존을 위한 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해 그 공급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농지확보와 무분별한 해산물 남획은 생태계파손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기근에 따르는 전쟁은 지구촌 생활환경 파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식량자원 확보차원에서 서구선진국으로부터 시작된 식량증산을 위한 유전자조작(GMO)식품과 비료, 농약의 생산은 획기적인 식량증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중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분류를 CMR이라하는데 이는 발암성(Carcino-genicity), 돌연변이성(Mutagenesis), 생식독성(Reprotoxic)의 전문용어 약자로서 발암물질은 말 그대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돌연변이성 물질은 체세포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생식독성물질은 불임가능성을 높이는, 즉 생식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CMR은 알게 모르게 우리주변을 심각하게 둘러싸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자신은 심각성을 모른 채 이러한 CMR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식탁의 풍성한 음식물이 차려 지까지의 과정에는 수많은 농약과 보존재가 뿌려지고 첨가된 상태로 유통되어 왔는지 정작 최종소비자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성유기물로 제조된 농약의 1차 피해는 경작지이고 2차는 경작농민, 3차는 소비자입니다.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지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각종미생물이나 곤충들이 농약에 의해 소멸되어 복원력을 잃게 되며 토양의 산성화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농약과 비료를 투입하개 되고 결국에는 복원력 손상을 입은 경작지는 소출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2차적 피해자인 농민의 피해는 퇴행성 신경질환과 호흡기질환입니다. 우리 농촌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환자가 도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예로 선진국 프랑스에서 2006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뇌신경장애에서 농민은 도시인에 비해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농민 15.2%, 도시인 5.2%) 3차적 피해인 소비자들의 실태도 역시 대부분 그 결과가 만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후 증상을 인지했을 때는 원인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유기물에 비해 유기화합물의 잔류 기간은 매우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이는 인체의 축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량의 잔류농약이 포함된 음식이라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어느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질병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식품보존재입니다. 물론 정부 규제에 의한 일일 허용기준량이 있지만 보존재 역시 합성유기물이므로 잔류기간이 길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진 대사량도 떨어져 체내 축적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독성화합물의 독성은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보다 몇 가지가 섞이게 되면 독성이 수십배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 하에서 각종 기호품들은 더욱더 독성폐해를 증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음주흡연문화의 개선과 함께 청소년들의 늘어만 가는 음주흡연과 기호식품의 규제에 회기적 장치를 범정부차원으로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독성물질의 주류인 염기를 중화하기 위해 식초를 이용하거나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들에겐 먹 거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natimes@naver.com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